덥다.
땀방울에도 기억이 있는걸까.
송글송글 솟는 땀방울 중 몇 놈이 수년전의 기억을 갑자기 쏟아내는걸 보면...
옥탑방에 살아본 적이 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근래 영상매체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옥탑방의 씬들이 떠오른다.
널찍한 옥상에는 평상이 하나 있고,
기다란 파란색 화분에는 색색이 이쁜 꽃들 혹은 화초.
심지어는 상추를 심어먹거나 방울토마토를 기르기도 하고..
네온사인 건물들을 내려다보며 바베큐 파티를 하기도 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등장하는 연인들은.
반.드.시. 함께. 빨래를 한다.
쨍쨍한 날씨, 벽돌색 고무다라.
그 안에는 1년 묵은 빨래를 하는건지 왕창의 빨래들.
콧노래 하며 박자 맞춰 손 붙잡고 발구르는 젊은 연인.
어떻게 다 헹굴라는지 미친듯한 거품.
- 아 여기서 잠깐! 이 거품, 꼭 상대방의 콧잔등에 한번쯤 묻혀주는 센스 -
그리곤 새파란 하늘아래 빨랫줄, 빨래 끝~ 옥시크린!
* *
21세기 들어 TV가 부여해준 살폿 낭만있고 동경스러운 이 이미지를
요새의 옥탑방은 잘 반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20세기의 마지막 해. 내가 살던 옥탑방을 말하자면 한마디로 "갓 뎀"이었다.
약간 반항아적 기질 있는 막내아들내미한테 내줄려고 만든 옥탑방이 아니라면,
국어사전에도 없는 (옥상방이었다면 사전에 실었을래나?),
서울에만 존재한다는, 건축법상 불법인 이 옥탑방은
그저 한달 월 수 조금이라도 더 땡길려는 불손한 목적이 태반이고,
옥상 위의 탑(塔)같은 방에라도 살아야 할 만큼 없는 사람들이 또 고객인지라
이중창이니 하이샤시니 따위는 너무 고결하여 끼어들 여지도 없이.
스티로폼 한겹 더 덧대준다면 그대는 그나마 양심있는 건물주, "쌩유"
그저.
여름엔 죽을 것 처럼 덥고
겨울엔 죽을 것 처럼 추운 곳.
그렇게 바깥의 기온을 맹목적으로, 가감없이 순수하게 반영하는 곳이
내가 아는 옥상위 탑같은 방의 진정이다.
옥탑방의 여름은.
참.. 징그럽게도 더웠다.
단 0.1도 라도 낮추고픈 바램으로 콘크리트 옥상에, 지붕에, 벽에
수도호스를 부여잡고 뿌려대던 기억이 난다.
그러고보니 누구는 더워서 울기도 했었지... 후훗.
백 년만의 무더위라고 떠들어 대는 올 해.
(그눔의 '백년만의'는 왜 해가 안늘어. )
에어컨없이, 더위에 지쳐 투덜대고 싶은 이 방의 후끈 열기는
옅어진 시간 속 똑똑한 땀샘의 기억으로 인해
어느덧 순식간에 "따뜻함"으로 신분 강등되어 머리 조아리는 것이다.
* *
10대부터 60대까지 더위를 이기는 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빙수먹는다, 아이스케키먹는다, 영양탕먹는다 등등인데,
60대 어른들의 대답이 참 많은 생각을하게한다. "참는다"
60번의 여름을 맞아보니 결국엔 참는게 젤이라.. 라는 것일까.
지내보니, 오래 사신 분들의 말씀 들어 나쁜게 없던데..
참자.
더우냐.
샤워 한번하고 선풍기 바람쐬며 참아라.
지난겨울 그토록 기다리던 여름이 아니더냔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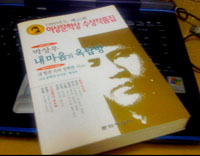 |
ps. 그해,
감정이입 이빠이하며 읽은
1999년도 제 23회 이상문학상 수상집
박상우 / "내마음의 옥탑방" (추천!)
'일상-별일없이산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누구에게나 왕년은 있다. - 한희정 (0) | 2007.05.20 |
|---|---|
| 턱관절과 Invisible wound (8) | 2007.01.29 |
| 2006년 영동세브란스 왼쪽 턱관절(턱디스크) 수술 후기 #1/2 (2) | 2007.01.13 |
| 밝고,맑고,명랑을 위한 기원 (0) | 2006.11.09 |
| 안마사 - 시각 장애인만 허용 법 가결 (0) | 2006.08.29 |
| 입을 다스리는 글 - 선운사에서 (0) | 2006.03.27 |
| 본질을 볼 수 있는 눈 (0) | 2006.03.19 |
| 요즘,,, 재미없음. (0) | 2006.03.14 |
| 아.. 졸려 죽어. (0) | 2006.03.06 |
| 그리움이란 (0) | 2006.02.24 |

